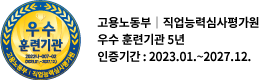KMAC 콘텐츠
경영의 창
- KMAC의 시각에서 경영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 고객센터
- KMAC 컨텐츠
- 경영의 창
-
[9월 CE] 파리올림픽을 통해 본 세대 변화
- 첨부파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4/09/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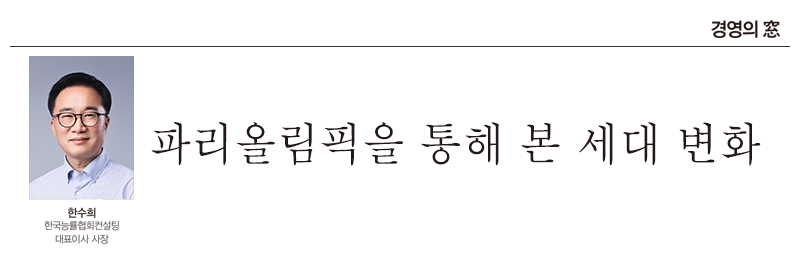
파리올림픽이 무수한 이슈를 남기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Z세대’ 태극전사의 돌풍에 관한 것입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16명 중 10명이 2000년대생이었고 그들이 목에 건 금메달은 전체 13개 중 12개에 달했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48년 만의 최소 인원 출전으로 당초 목표의 2.6배 금메달을 획득하는 최고의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파리의 기적’을 써낸 Z세대 선수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들의 말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질 자신이 없었다. 준비가 돼 있어서”(펜싱 도경동), “경험이 없는 것이 단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면 부담 없이 뛸 수 있다”(사격 반효정), “메달 유력 후보가 아니라고 해도 신경 안 썼다. 순간을 즐겼다”(사격 오예진).
이처럼 그들은 당당함을 무기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승리로 이끈 건 노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었고 그렇기에 ‘팀 코리아’로 나섰지만 국가대표 타이틀이나 메달 개수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영길 한국체육대 교수는 그들이 “팀을 개인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활용할지를 생각한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Z세대의 목표에 이르는 과정,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은 우리 기업이 젊은 세대를 어떻게 동기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시합니다.
파리올림픽이 남긴 또 하나의 교훈은 ‘시스템의 중요성’입니다. ‘전투 민족’이라는 말을 증명하듯 총, 칼, 활, 즉 사격, 펜싱, 양궁에서만 무려 10개의 금메달이 쏟아졌는데 왜 이 종목들이 성과를 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양궁의 경우 직전 대회 3관왕도 탈락할 만큼 오직 실력만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합니다. 여기에 진천선수촌에 파리올림픽 경기장을 똑같이 재현하고 대회 기간에는 도보 5분 거리 호텔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지며 어김없이 금빛 과녁을 명중시켰습니다.
사격의 경우 본선 결과만으로 선발하던 방식에서 결선 최저점 선수를 한 명씩 탈락시키는 녹아웃(Knock-out)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오랜 관행을 깨고 올림픽에 맞는 선발 방식으로 개선해 도쿄올림픽의 부진을 씻은 것입니다.
펜싱은 팀워크의 승리였습니다. 그동안의 국제 무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전체적인 경기력을 향상시킨 결과 남자 단체전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양궁의 현대차그룹처럼 펜싱에서는 SK텔레콤이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예전처럼 “은메달이라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스포츠 정신. 그것은 공정한 평가와 정당한 보상을 중시하며 자신의 값어치를 높여가는 Z세대의 가치관과 닿아 있습니다. 이 또한 파리올림픽이 기업들에 남긴 교훈이자 동시에 숙제가 아닐까요.
한수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대표이사 사장